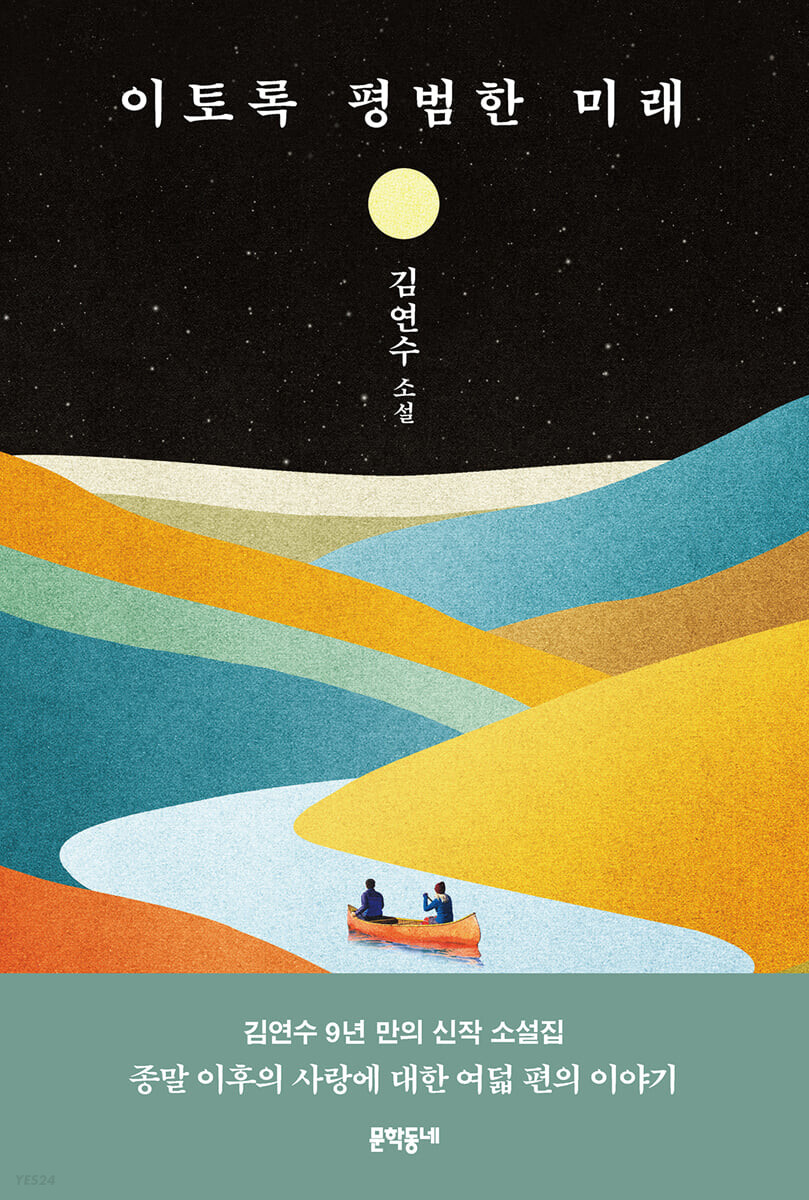
단편 별로 몇가지 흥미로운 구절 (나중에 다시 곱씹어볼만한)이나 생각을 적어 본다.
이토록 평범한 미래
소설 내에 나오는 김원이라는 작가가 쓴 '자유로운 마음'이라는 내용이 화자에게 날아오다.
사람들은 인생이 괴로움의 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존재의 기본값은 행복이다. 우리 인생은 행복의 바다다. 이 바다에 파도가 일면 그 모습이 가려진다. 파도는 바다에서 비롯되지만 바다가 아니며, 결국에는 바다를 가린다. 마찬가지로 언어는 현실에서 비롯되지만 현실이 아니며, 결국에는 현실을 가린다. '정말 행복하구나'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불안이 시작되는 경험을 한 번쯤 해봤으리라.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말했는데 왜 불안해지는가? '행복'이라는 말이 실제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대신한 언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그 뜻이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야기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이야기의 형식은 언어다. 따라서 인간의 정체성 역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다랄진다. 이렇듯 인간의 정체성은 허상이다. 하지만 규정하는 것도 언어이므로 허상은 더욱 강화된다. 말로는 골백번을 더 깨달았어도 우리 인생이 이다지도 괴로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
플롯은 보고 있는 웹툰 중 하나인 '오직, 밝은 미래'와 매우 유사하다. 첫번째 생이라 할 수 있는 현실에서 실패하고 절망스러운 '나'는 어떠한 계기도 시간을 거꾸로 살게 된다. (하루씩 어제로 돌아가는 것) 두번째 생이라 할 수 있는 시간의 거스름 속에서 '나'는 무심히 흘러보낸 시간을 되찾고 나의 슬픔과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피게 되고 다시금 원래대로 시작되는 세번째 생에서는 과거에 얽매이기 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된다.
난주의 바다 앞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순간 사람은 바다를 찾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삶'을 놓아서는 안된다.
생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정난주'는 자식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였다. 하나님은 그런 난주에게 다시 살라고 한다.
'난주'의 바다 앞에서 유민은 삶을 선택했다. 세컨드 윈드는 그 고비를 넘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 세컨드 윈드
운동하는 중에 고통이 줄어들고 운동을 계속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상태로, 운동 초반 호흡곤란, 가슴통증, 두통이 극심해지는 사점(dead point)를 넘기게 되면 나타나는 2차 정상상태.
바얀자그에서 그가 본 것
바얀자그에 한 번 가고 싶어졌다.
사랑의 단상 2014.. 2023?
한해가 저무는 중, 송년 특집 프로그램을 보는 지훈에게 전화를 건 리나는 '신년에 맞춰 금연결심하듯이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라고 말한다. 지훈은 'valiente'라는 스페인어를 떠올린다. '용감한, 멋진'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이 뜻은 '사랑의 용기'를 표현하는 언어이기도 하다. 지훈이 리나에게 용기를 표현하는 순간이다.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었던 가끔 어렴풋한 기억을 떠올려 본다. 기억력이 좋은 아내만큼은 기억할 능력은 없지만, 한국식 나이 30이 되기 직전 12월 31일 우리는 만났었다. 이미 그 때 잠실 롯데월드타워는 하늘 높게 솟구쳐 한참 전 석촌호수를 둘러보던 그 풍경이 아니었다. 늘 그렇듯 12월 31일은 추웠다. 그날도 조금은 쌀쌀했었다. 아내는 업무 관련한 서적을 들고 있었는데, 표현하자면 똑부러진 느낌이 들었다. 첫 만남이라 생각해놓은 음식점은 죄다 문을 닫았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로 가서야 비로소 따뜻한 곳에 앉을 수 있었다. 지금에서야 유쾌한 기억이지만, 참 아찔했던 석촌호수 뒷편을 거닐던 그날의 모습. Happy New Year ! 기쁜 새해에 다가온것처럼 나도 마음 한켠에 valiente가 다가와 지금에 이르렀음을 생각해본다.
다시, 2100년의 바르바라에게
'나'라는 사람은 앞세대와 뒷세대를 연결해주는 고리이기도 하다. 그것이 한 사람이 200년의 세월을 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할아버지 인생에서는 두 명의 바르바라가 나타난다. 조선시대 천주교가 전파되던 시절, 천주교 집안이었던 할아버지의 조상이 알고 있던 바르바라는 정조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병에 걸려 목숨을 잃는다. 할아버지의 막내 여동생이었던 바르바라는 북한 정치보위부 요원에 의해 처형되는데, 마지막에 할아버지는 우연히 새마을호 기차에서 그를 만난다.
손이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의 기억 속에서 할아버지는 끝끝내 미래의 바르바라를 떠올려 본다. 조금 더 나은 사회 속의 바르바라를 만나길 바라는 마음이었을까.
'Short thought > From 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삐뚤어진 리더들의 전쟁사1 (0) | 2023.01.19 |
|---|---|
| 홍학의 자리: 인간의 선입견을 통렬히 부숴주는 웰메이드 소설 (0) | 2023.01.17 |
| 법정에 선 수학: 수학이라는 무기 (0) | 2023.01.11 |
| 인스타 브레인 (0) | 2022.12.28 |
| 당신 인생의 이야기: 어쩌면 있을 법한 (1) | 2022.12.26 |



